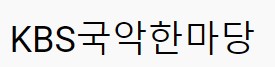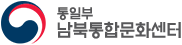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4.29 (월)
[Pick리뷰] ‘적로’, 박종기와 김계선의 예술혼 극으로 승화
국악원 2024년 첫 기획공연 음악극 ‘적로’
불꽃같던 삶과 예술혼 구성진 가락로
“극적 연출과 전개의 급박함은 아쉬움”
- 정수현 기자
- 등록 2024.02.01 00:00
- 조회수 61,228

[국악신문=정수현 전문기자] 국립국악원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첫 기획공연으로 음악극 ‘적로’를 풍류사랑방에 올렸다. ‘적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금 명인 박종기(1880~1947)와 김계선(1891~1943)의 삶과 예술혼을 그린 작품이다. 배삼식 작가, 최우정 작곡가, 정영두 연출가가 참여한 이 공연은 2017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국립국악원의 민간단체 우수 작품 재공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보여졌다.
박종기는 민속악 대금산조 명인으로, 판소리에도 조예가 깊어 진도아리랑의 선율을 정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계선은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국립국악원 전신) 소속 단원으로 정악 대금 명인이었다. 배삼식 작가는 가상의 ‘산월’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두 명인이 젊은 시절 인연을 맺었던 그녀와의 아름다웠던 한때를 추억하며, 치열하고 뜨거웠던 젊은 날을 더듬어가는 이야기를 완성해 냈다. 두 인물의 역사적 사실 기반에 작가적 상상을 더 하여 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성살이를 마치고 고향인 전남 진도로 내려가려는 종기를 두고 계선이 가지 말라며 만류하고, 그러던 중 두 사람 앞에 난데없이 그들을 모셔 오라는 인력거가 등장한다. 그들이 인력거를 타고 향한 곳에는 두 예술가가 십수 년 전 만나 사랑했던 기생 산월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산월이 있었다. 산월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덧없이 빠르게 흘러간 옛 시절을 추억하며 각자가 겪었던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로 부르고, 이야기하며 애틋한 추억을 되새긴다.
‘적로’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국립국악원의 풍류사랑방의 느낌과 잘 어울렸다. 간접조명이 활용된 작은 무대에는 대금이 연상되는 시원한 느낌의 나무의 잎이 나부끼고, 따뜻한 술상이 차려있는 선비의 아늑한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1940년대 경성이 연상되는 스윙(Swing) 재즈가 경쾌하게 흘러나오며 무대가 시작되었다. 음악은 대금 두 대와 건반, 아쟁, 클라리넷, 타악기,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장면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이 연주되었다. 연주자들은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의 발 뒤에서 세 명의 배우를 받쳐주며 다양하고 조화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박종기와 김계선은 옛 시절 함께 했던 그리운 산월을 생각하며 지난 세월 그들이 지나온 어린 시절, 대금과 함께한 시간 등을 노래하고, 절절하게, 혹은 기쁘게 불꽃같던 그들의 삶과 예술혼을 구성진 가락의 소리로 채워나갔다. 대사와 소리는 때로는 유쾌하며 해학적이고,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고 묵직한 슬픔을 던지기도 하며 그들의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이 옛 추억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부분은 전통 어법이 가미된 창작 판소리와 뮤지컬 느낌의 창작곡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시절이 좋구나’의 경우 스윙 베이스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직관적인 가사와 유쾌한 선율로 뽑아내고, 서정적이고 대중적인 코드 진행에 세 명의 배우가 각자 다른 파트를 노래하며 뮤지컬 창법으로 부른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쉬웠던 것은 장르의 구분이 모호했다는 것인데,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한 시도는 좋았으나 소리극의 매력이 반감되고 이질적인 느낌을 받아 아쉬웠다. 하지만 창작 소리의 경우 한국적이고 서정적이며 고즈넉한 분위기의 가사가 특히 마음을 울렸는데,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설움이 아닌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는 문장이나, ‘팔자소관’을 이야기하며 젓대쟁이로서의 삶을 묵묵히 그려내는 모습에서 예인들의 예술혼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 산월 역을 맡은 가객 하윤주가 중간중간 부르는 애절한 정가 풍의 노래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워 무언지 모를 추억에 젖게 해 주었다.


음악의 경우 대금을 두 대 활용하여 연주한 것이 흥미로웠다. 두 악기가 다양한 기법을 연주하며 다이내믹하게 어우러져 대금의 매력을 선사해 주었고, 이는 대금 연주자였던 두 예인을 나타내는 극과도 잘 어울렸다. 하지만 대금 두 대의 소리가 다양하게 활용된 곡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각 테마에 맞춘 주제 선율이 극을 관통하여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이 극이 지닌 특색이 두드러진 것도 음악의 특징 중 하나였다. 또 클라리넷을 활용하여 오묘하면서도 어두운 색채를 함께 드러내 무언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영화 음악적인 느낌을 준 것이 신선했는데, 극의 초반부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이슬’을 형상화한 피아노 선율은 극 말미에 과거의 산월이 등장하며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장치로 활용되어 음악적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극 ‘적로’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새롭게 각색된 이야기 전개가 신선했고, 대중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할 만한 요소 또한 많았다. 그러나 두 예인의 예술혼이나 인생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산월’이라는 인물과의 추억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플롯, 또 과잉 감정으로 치닫는 전개가 아쉬웠다. 갑작스레 극적으로 전개된 내용과 슬픔 어린 느낌으로 연출된 진도씻김굿, 망자 굿에 치중한 장면은 두 예인을 나타내고자 한 것인지, 가상의 인물 산월을 기리고자 한 것인지 모호하여 극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주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극은 실존 예인들의 치열한 예술적 삶이나 무언가 더 발전될 이야기 전개가 아닌, ‘덧없음’에 중심이 맞추어져 모두가 공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기대하기 쉬운 주제, 즉 두 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 생과 사, 공허함에 초점을 맞춤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무대를 꾸려 나간 것은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그 주제로 발전하기 위한 극적 연출과 전개가 급박하고 어수선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 시놉시스나 극 소개에 나와 있는 ‘불멸의 소리를 찾아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 끝에 여울져 맺힌 그들의 예술혼’이라는 주제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극을 이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음악극 ‘적로’가 오랜 사랑을 받아 새롭게 연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도와 뚝심 있는 전통의 색채가 동시에 묻어나 발전되기를 바란다.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국악신문 소장자료] (42)아리랑 최초 취입 아리랑, ‘1913년 京城卵卵打令’
일본 니포노폰 취입 조선민요 ‘경성란란타령’, 1913년 Nipponophone 6170 SP음반.(국악신문 소장자료)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2)<br>분청철화어문병편
쏘가리 문양 도편 한 점 없이 이규진(편고재 주인) 계룡산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조선 왕도로서의 도읍지를 생각한다면 무학대사를, 민속신앙의 터전을 염두에 둔다면 신도...
-

[국악신문 소장자료] (41)’무궁화노래‘가 처음 불려진 독립관(獨立館) 전경
1897년 8월 13일 ‘대조선 개국 505회 기원절 경축식’에서 계관시인 윤치호가 작사한 무궁화노래(찬미가 제10장)가 처음 발표된 독립관 전경. 현 애국가의 원형 ‘...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88)<br>김근희 명인의 '경기검무' 춤사위
경기검무 경기검무(京畿劍舞)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악기의 반주에 맞춰 칼을 들고 휘두르며 추는 춤 및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경기검무는...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
-

[인터뷰] 김경혜의 '시간의 얼굴' 작품전, 16일 개막
칠순을 넘어서는 길목에서 중견작가 김경혜(영남이공대 명예교수) 작가의 열번째 작품전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대구시 중구 슈바빙 갤러리에서 열린다.전시되는총 50여 개...
-

[Pick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이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후의 지휘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졌다. (사진=국립국악관현악단...
-

[PICK인터뷰] 국악인생 60여년,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한상일(1955~)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입문한 지 올해로 60여 년을 맞는다. 때 맞춰 지난 1월 25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서 선정하는 제15회 문화대...
-

[Pick리뷰] 명연주자 시리즈 ‘국악관현악-공존(共存)’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4 명연주자 시리즈 ‘공존(共存)’ 무대가 펼쳐졌다. ‘명연주자 시리...
-

[Pick리뷰]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12일부터 22일, 국립정동극장은 대표 기획공연 사업 ’창작ing’의 두 번째 작품,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을 무대에 올렸다. ‘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