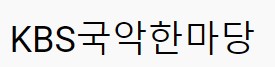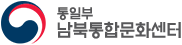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5.06 (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만났다. 기대한 탓일까?
그동안 사진으로 봤을 뿐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고서 사랑’, ‘책의 남자 박대헌’. 본보에 연재하고 있는 그 분이다.
매주 보내오는 원고에는 오타 한 자 없다. 올곧게 지켜가는 고서에 대한 신념이 담긴 진지한 글 속에는 가끔 웃음도 있다.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고집쟁이 어른이 아니다. K선배로부터 성품에 대해 들었던 터라 만나고 싶었던 분이다.
삼례역에서 걸어 5분, ‘삼례+책+마을’이다. 역에서 가깝게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삼례책마을 찾는 방문객들은 가는 길만큼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듯하다. ㄷ자형으로 잔디를 품고 있다. 평화롭고 사랑스런 풍경이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와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 책마을 덕에 빛나 보였다. 선생은 ‘고서점 호산방’ 주인이며 ‘삼례책마을조합’ 이사장으로 이곳을 일구고 지키는 분이다.
선생과 악속한 시간보다 한 시간 쯤 일찍 왔다. 점심을 먹고 나면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다. 삼례책마을 전경을 얼른 한눈에 넣고는 작은 도로를 건너 이름이 고운 ‘새참누리’ 식당으로 갔다.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몇 명의 일행이 들어왔다. 이곳을 잘 모르는 듯 한 일행과 그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한 중년.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중절모를 썼다. 크지 않은 체구에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몰두해 온 듯한 어깨와 나지막한 목소리까지 직감적으로 만나야 할 분임을 알았다.
연재 담당 기자로서 짧게 몇 번 통화한 선생의 목소리도 낯설지 않았다. 그들이 들어올 때 내가 앉은 자리를 지나게 되니 혼밥 하는 이가 있다는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나를 등지고 있었지만 나를 의식한 듯 보였다. 그래선지 얼마 후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첬다. 순간 나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 분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로 맞아주었다.
짧은 순간 사진으로 기억되는 전혀 다른 선생의 모습을 지워 버렸다. 다 먹어가던 참이었지만 식사하는 선생의 뒷모습이 혹시나 혼자인 나를 신경 쓰는 거로 읽혀져 바로 식당을 나왔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식당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인사는 생략되었다. 바로 오전에 올 줄 알았던 일행과 같이 움직여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말수가 적고 전문적인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유머가 배고 세심한 배려에 내가 그린 모습과 달랐고 훨씬 좋았다.
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처음 만난 일행과 함께 삼례책마을을 둘러보았다. 책마을은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해가려고 지었던 양곡창고를 개조해 박물관과 고서점, 전시관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화려하고 높은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허물지 않고 책마을로 탄생시켜 더 귀하고 가치 있어 보였다. 삼례역이 가깝게 있는 것도 일제가 쌀을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3가지 테마의 전시를 선생의 설명으로 볼 수 있었다.
먼저 '프랑스와 예술의 혁명' 전시다. 미라보 다리 시로 알려진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와 연인 마리로랑생’에 관한 전시와 ‘나폴레옹과 조선 서해안 항해기’, ‘근대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 되어 있다. 그 중에 폴 세잔의 작품도 있다.
나: 아폴리네르가 왜 좋아요?
선생: 나보다 잘 생겼잖아요.
두 번째로 ‘요정과 마법의 숲 그림책 미술관’이다. 1940년대 영국 동화작가 그레이브스와 나오미 헤더 그림책이 출간되지 않은 미간행 원고의 전시다.
마지막으로 ‘문자의 바다 전’이다. 기원전의 자료까지 희귀하고 진기한 작품들이다. 알 수 없는 문자, 그 뜻과 깊이를 알지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자료가 반갑기도 했다.
세 곳의 전시를 안내 받은 뒤 책방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 곳을 들어서면 책이 2층까지 쌓여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온 몸이 지식으로 채워지는 착각이 들었다. 나는 ‘백석’을 검색하기도 했다. 여유를 갖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저서를 찾아보고 싶었다. 이 소망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세계의 고서, 그림, 음반 등 많은 양과 희귀한 자료들.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선생의 혜안이 부럽다. 영월책박물관에서 오늘의 완주삼례책마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제도 있었다. 그러나 삼례에는 비로소 선생으로 하여 책문화 도시가 형성되고, 이것은 삼례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문화에 퍼지고 있다. 마당에 서니 선생이 흘린 땀으로 일구어진 ‘책의 꽃’이 삼례에서 피어 나고 있음을 5월의 신선한 바람이 알려 주었다.
전시관을 이동하면서 틈을 타 카메라를 내밀면 선생은 쑥스러워서 소년처럼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의 또 다른 분이다. 무뚝뚝한 표정을 지을 것만 같은데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다. 겉으로는 강한 듯 하지만 속은 여린 중년이다.
삼례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호랑이가 잡아 가면 어쩌나~”하면서. 오랜만에 듣는 옛날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었다. 창밖 점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
5월말의 삼례 책꽃 향기는 계속 서울로 가는 길까지 따라오고 있다.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1)<br>원주아리랑
원주아리랑을 쓰다. 한얼이종선 (2024, 한지에 먹, 40× 63cm) 아침에 만나면 오라버니요 밤중에 만나면 정든 님 일세...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3) <BR> 백자철화편병편과 수물(受物)편
같은 백자가마터 출토품이라는 것도 이규진(편고재 주인) 편병은 병을 만든 후 앞과 뒤를 누르거나 두드려 면을 만든 그릇이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만든 기...
-

[국악신문] 정창관의 ‘국악-신반’ <21>
윤하림 해금풍류 II 산조 윤하림 해금풍류 II 산조. (2024년 Sound Press 음반번호없음) 2023년 윤하림 ...
-

[국악신문 소장자료] (42)아리랑 최초 취입 아리랑, ‘1913년 京城卵卵打令’
일본 니포노폰 취입 조선민요 ‘경성란란타령’, 1913년 Nipponophone 6170 SP음반.(국악신문 소장자료) ...
-

[PICK인터뷰] 원장현 명인, “산조는 우리 삶의 소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

[Pick리뷰] 경성 모던걸들의 춤판 '모던정동'…"자유 갈망하는 모습 담아"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

세실풍류,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선사한 안덕기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

세실풍류, 동해별신굿 민속춤사위를 제해석한 조재혁의 '현~'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Pick리뷰]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절창 정선아리랑!’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