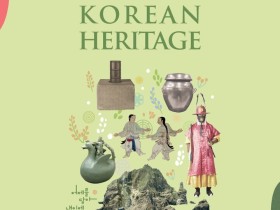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도요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이규진(편고재 주인)
경기도 광주 일대에 설치되었던 사옹원의 분원, 즉 관요는 기본적으로 왕실용 진상자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진상자기는 예번(例燔)과 별번(別燔)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번은 궁중에 연례적(정기적)으로 진상했던 자기를 말하며 별번은 별사기(別沙器) 또는 별번사기(別燔沙器)라고 하는 것으로 가례나 사신 접대 등의 용도로 특별히 제작된 것을 말한다. 정조 19년(1795) <일성록(日省錄)>에 예번은 가마 천정까지 쟁일 수 없고 별번은 가마 천정까지 쌓을 수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별번과 달리 예번은 갑발에 넣지 않고 포개 굽지도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번을 일률적으로 갑발에 넣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명색이 궁궐에 보내던 진상자기인데 예번 중에도 갑발에 넣어 만든 고급품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왕실자기를 제작했던 관요에서는 예번과 별번만 있는 것도 아니다. 상번(常燔)도 보이는 것이다. 이 것은 갑발에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개어 굽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포개어 굽는 방법은 고려청자나 분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포개어 굴 경우 그릇끼리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굽 밑에 내화토나 모래를 깔든가 태토빚음받침을 받치게 되며 따라서 그릇의 내저에는 흔적이 남게 된다,

백자접시편은 조선 초기 관요 중의 하나인 우산리 9호 출토품으로 전형적인 상번백자다. 죽절굽 안에 떼어내지 않은 공기돌만한 크기의 태토빚음받침이 4개 붙어 있으며 그릇의 안쪽에는 또 커다란 내저원각 안에 4개의 태토빚음받침을 떼어낸 흔적이 보이고 있다. 백자접시편은 예번이나 별번처럼 상품의 백자가 아니다보니 색 또한 밝지 않고 탁한 느낌의 흰색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번이나 별번이 아닌 이 상번의 백자접시편은 어디서 누가 사용키 위해 만든 것일까.
도자사를 보면 귀족문화를 연상케 하는 고려청자와는 달리 분청사기는 흔히 서민문화와 연결시켜 보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말이지 분청은 서민문화의 아이콘일까. 아니 조선 초기의 백자들 또한 하품이라고 하면 서민이나 하층민들의 전용물이었을까. 조선 초기의 도자기들은 하품이라고 해도 서민들까지 흔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다. 서민 전용이라면 왜 궁궐터에서도 예번이나 별번이 아닌 하품의 도편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종합해 보면 나로서는 도자기 하품과 서민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하자면 예번이나 별번이야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상번이나 하품이라고 해서 서민들에게 까지 두루 쓰일 정도로 도자기가 흔했던 세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백자접시편은 손상을 입은 상태이지만 불구의 몸이 아니더라도 인기를 끌만한 것은 아니다. 완전하다 하더라도 탐을 낼만한 물건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 백자접시편이 만들어지던 조선 초에도 이런 정도의 도자기는 지금처럼 관심 밖의 물건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 정도의 도자기만 하더라도 당시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중국과 우리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런 도자기들을 예번이나 별번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관심 밖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가령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보았다면 지금의 우리처럼 시큰둥한 표정이었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감지덕지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민요도 아닌 관요에서 만들어진 하품의 백자접시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다 보니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 초의 도자기들, 그중에서도 관요에서 만들어진 상번은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되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백자접시편을 보아도 무척 재미가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굽에 붙어 있는 태토빚음받침은 도요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흥미로워 보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2‘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3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4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5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6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
- 7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8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
- 9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새로운 얼굴 찾아요”
- 10아리랑 사이트 운영자 정창관 선생 따님 시집 보내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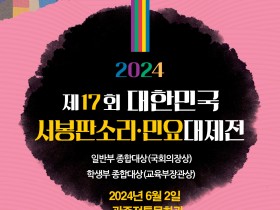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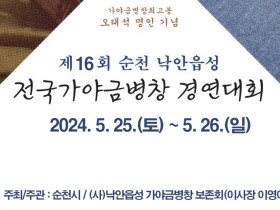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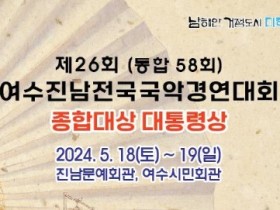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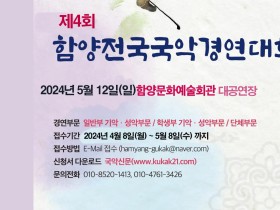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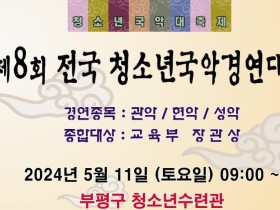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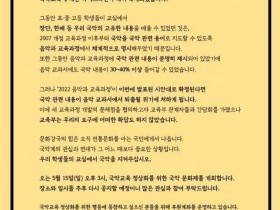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https://www.kukak21.com/data/file/news/thumb-3534942082_xLDkmVCO_6c0ab4c0f9bda5791258891bcfab9234ab950fbd_280x2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