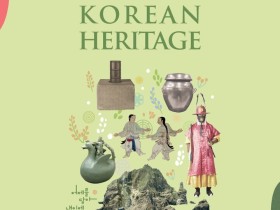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흙의 소리
이 동 희
유랑流浪 <1>
아무래도 무리하고 무모한 길이었다. 박연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혼자는 몇 번 오르내렸지만 나약한 여인을 끌고 같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이 큰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친 걸음이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길 바랄 뿐이었다. 그가 늘 그러는 것처럼 하는 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것이다. 집에서도 그랬고 관직으로 일을 할 때도 그랬다. 부모에게도 그랬고 아내에게도 그랬다. 공부를 할 때 스승에게도 그랬고 유생들에게도 그랬다. 피리를 부는 데도 그러하였고 짐승에게도 그리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묘 앞에 모셔 놓은 호랑이 친구에게도 그리하였다. 산천초목 무엇에나 그렇게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묻어 준 그 친구에게도 문안을 하리라, 생각하였다.
"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요?”
다래가 그의 손에 끌려 따라오며 물었다. 힘이 드는지 아양을 떨고 웃음을 흘리지는 않았다.
"내가 지금 자네 생각 말고 무슨 생각을 하겠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허허허허… 잘 다녀와야 될 터인데 걱정을 하고 있었어.”
전혀 딴 얘기는 아니었다.
"호호호호… 그렇게 걱정이 되셔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나?”
"호호호호… 염려 마셔요. 길에서 주저앉지는 않을게요. 그 대신좀 쉬었다 가요.”
"그래야지. 허허허허… 그래, 그럼.”
참으로 귀엽기도 하고 착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쉬려고 하였다. 줄곧 걷기만 하여 목덜미에 땀이 흥건했다. 다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숨을 헐떡거렸다. 수원 근방까지 온 것이었다.
"어디 좀 쉬고 요기는 좀 더 가다가 할까?”
"그래요, 선생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래는 아무 데고 퍼질러 앉는다. 그도 그녀의 옆으로 가서 앉을만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처음부터 너무 강행군이지?”
"선생님은 따라갈 테니 염려 마셔요.”
숨을 계속 헐떡거리면서 말은 그렇게 하였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땀을 들이고 다시 걸었다. 박연이 잡아 끈 것이다. 몇 번 내를 건느고 산을 넘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나절이 겨워서 지나게 된 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이었다. 병점餠店, 떡 전골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저앉았다.
"많이 걸었네. 좀 쉬었다 가지.”
"좋지요.”
다래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털썩 앉는 것이었다.
우선 떡을 한 쪽씩 떼어 주는 대로 난전에서 손에 받아먹었다. 콩나물국에 물김치도 벌컥벌컥 마시었다. 요기가 되는 대로 마루로 들어앉아술도 한 주전자 시키었다.
첫잔은 그냥 마시고 두 번째 잔은 서로 부딪었다.
"우리 잘 해보세.”
"네에. 선생니임”
"허허허허… ”
"나는 집채 무너지는 줄 알았어. 허허허허…”
박연은 참으로 기특한 다래를 바라보고 계속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던 다래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배를 잡고 웃어댄다.
"호호호호…”
볼수록 기특하고 귀여웠다.
"너무 무리한 것 같애. 되는 대로 가자고.”
다래는 무슨 대꾸 대신 잔을 들고 계속 웃기만 하다 스승에게 한잔 가득 따라 준다.
"호호호호… 언제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셨어요?”
"허허허허… 그랬던가?”
다래는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였다. 그러나 박연의 마음 한구석은결리었다.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궁중의 여악을 폐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그녀는 졸지에 낭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보다 시대와 나라와 명분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늘 푼수가없는 도량이기도 하지만 늘 그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술을 두어 잔씩 더 하였다. 국밥을 한 그릇씩 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가 눈을 붙이고 한 심씩 잤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기 전에 일어나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박연은 눈을 붙이기 전에 길 안내를 받았던 것이다. 한참 가다가 있는 보적사寶積寺라는 고찰 그리고 그 주변 경관에 대해서 알아두었다.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다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2‘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3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4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5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6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7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8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
- 9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
- 10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새로운 얼굴 찾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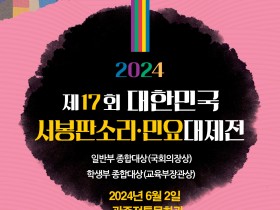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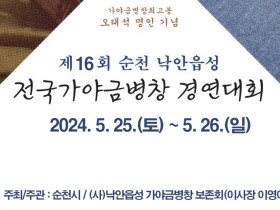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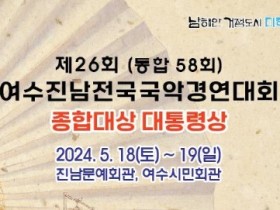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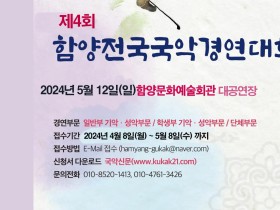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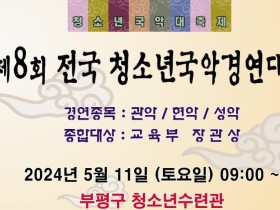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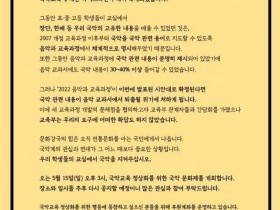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https://www.kukak21.com/data/file/news/thumb-3534942082_xLDkmVCO_6c0ab4c0f9bda5791258891bcfab9234ab950fbd_280x2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