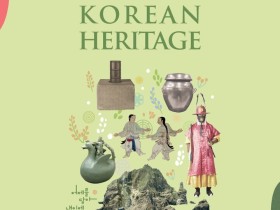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흙의 소리
이 동 희
나무와 숲 <5>
"뭐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네가 제일 귀하다는 거여.”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왜 정말이 아닌 말을 말하겠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나이의 가슴을 끌어안고 목덜미를 휘감는 것이었다.
"저는 요오,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이어요.”
"높으신 어른에게 이러면 되는 기여?”
"그럼요. 뭐가 안 될 것이 있어요. 싫으셔요?”
"높은 것 하고…”
"좋은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
"그야 말해 뭘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지요 뭐.”
"뭐는 뭐여?”
그녀는 다시 더 가슴속을 파고들며 끌어안는 것이었다. 턱수염에 입술은 마구 문지르며. 저고리를 다 풀어헤친 채로였다.
처음은 아니었다. 그녀가 술에 취할 때마다 그랬다. 그리고 언제나 그가 자제력을 발휘하여 사태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몸을 빼었다. 목석이 아닌 그도 무척 힘들었지만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러진다고 생각하고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늘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다. 신주처럼. 마지막 보루처럼. 어쩌면 그런 것을 믿고 그녀는 또 그러는지 모른다.
"잠은 깬 기여?”
"예. 잠도 깨고 기운이 났어요.”
"그럼 일어나. 일찍 길을 나서자고.”
"예에.”
대답은 바로 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한참 동안 더 꾸물거리고 있는다. 그러다 양팔을 쭈욱 뻗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매무새를 차리는 것이었다.
두 훼 닭이 울고 어둠이 가셔지기를 기다려 길을 떠났다.
짐을 가볍게 꾸렸다. 괴나리봇짐 속에 무게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버리고 미투리와 노자 그리고 피리 한 자루만 챙기었다. 다래의 짐을 그가 조금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그녀가 끌고 온 거문고는 객줏집 벽장 속에 넣어 두었다.
가벼운 차림으로 걷다가 자다가 가는 데까지 가려는 것이다. 다래는 거문고를 걸머지고 가겠다고 하였지만 그가 말렸다. 사실 이렇게 결행을 한 목적이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또 구실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또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그녀의 몸을 빼내자는 것이다. 누가 있어 그 사생결단의 치정극에서 헤어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왕이라 하더라도 왕자들의 얽힌 관계를 풀 도리가 없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그 수렁-꿀과 같은 감미로운-바닥 속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없었고 아니 아예 의지 자체가 없었다. 꿀사발을 누가 빼앗지 않고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가 아니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임이 두텁고 개혁 정책을 입안하는 실세라 하더라도, 설사 백전노장이라 하더라도, 덤터기만 쓰기 십상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자청해서 말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걸음만 재촉하였다. 먼동이 터 오고 퍼언하게 길이 펼쳐졌다.
"부지런히 가야 해야.”
"알았습니다요.”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며 다래가 여전히 아양을 부렸다.
"한나절 될 때까지 가다가 요기를 하고…”
"한심 자고요.”
"그래 그러고 해거름에 걷는 게 좋을 거여.”
"잠은 또 자야지요.”
"그럼 잠은 자야지. 다래 소리도 들어보고…”
"그럼 또 한잔해야지요.”
"해야지.”
그의 걸음은 가속도가 붙어 빨라졌다. 산과 길과 물이 이어졌다. 고개를 넘을 때는 멀리 우거진 숲이 보이었다. 그럴 때마다 땀을 들이고 쉬며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무만 보았어. 숲은 못 보고.”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숨이 몹시 찬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허허허허…… 멀리 보아야지. 앞만 보고 살았던 거여.”
울울창창한 숲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몰아치던 일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갈급하게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억지로라도 복대기탕 속에서 벗어난 것이 참으로 잘 한 것 같다. 그랬다. 물론 다래에게도.
그는 끙, 힘차게 소리를 내며 일어나 다래의 손을 잡아끌었다.
"부지런히 가야지.”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2‘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3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4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5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6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7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
- 8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9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
- 10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새로운 얼굴 찾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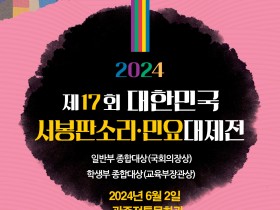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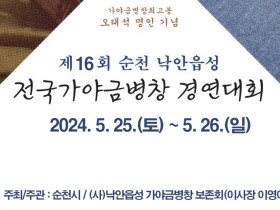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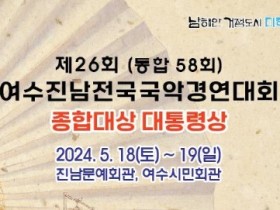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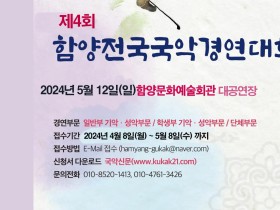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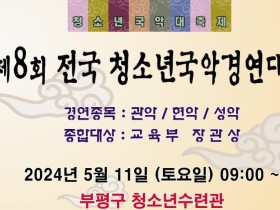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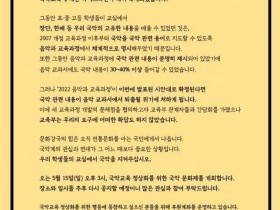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https://www.kukak21.com/data/file/news/thumb-3534942082_xLDkmVCO_6c0ab4c0f9bda5791258891bcfab9234ab950fbd_280x2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