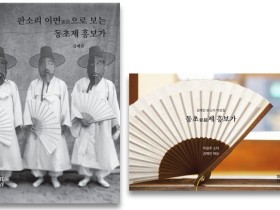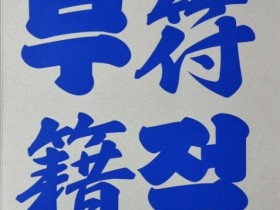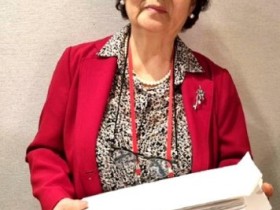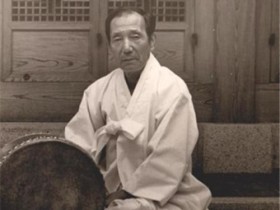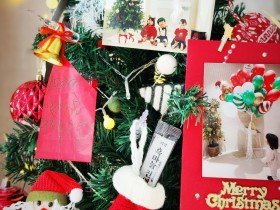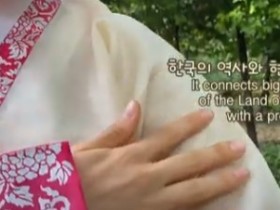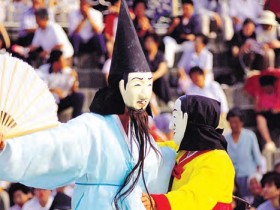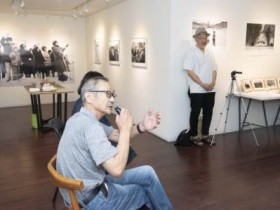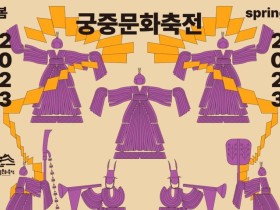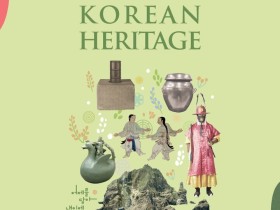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이윤선(문화재 전문위원)
한자어 '민요(民謠)'는 성종실록에 한 차례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민요'보다 '민속가요(民俗歌謠)'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효종실록에 각 1회씩 5회 출현한다. 지배 권력을 갖지 못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지칭하는 개념어는 민요가 아닌 '이요(俚謠)'였다. 속된 노래라는 뜻을 갖는 '이요'는 한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로 지어 부른 노래를 지칭하는 말이라 해석된다. 배인교가 <일제강점기 민요의 개념사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의해 두었다. 여기에서의 '민속가요'가 속가(俗歌) 혹은 민요(民謠)다. 그렇다면 '이요'로 호명되던 노래가 어찌 민요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는가.
선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바는 1920년대 민요의 발견 혹은 재발견이다. 민족과 민중이란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따라서 이 용어의 남상(濫觴)과 태동은 가요와의 병립 속에서 추적해야만 한다. 20세기 초 계몽의 시대를 거치며 종묘제례악에 쓰이는 의례용 음악에서부터 여자 기생들의 노래와 민간의 노래를 두루 일컫던 명칭은 '가요'였다. 고려민요라고 하지 않고 고려가요라 하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임경화는 그의 논문 <'민족’에서 ‘인민’으로 가는 길: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의 보편과 특수>에서 가요와 민요의 분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호명은 점차 서민예술에 기반한 전통적 노래 양식을 지칭하는 말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가요를 '민풍(民風)'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시기였다. 이때의 가요에 대한 생각은 '풍(風)'의 요체를 민속가요의 시 혹은 여항(閭巷)의 노래에서 기원한 노래로 규정한 '시경(詩經)' 이래의 전통이다.
주지하듯이 '시경'의 50% 이상이 '풍(風)'이라는 민요다. '민요'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상 새로 발명된 용어다. 민속, 민예, 민중 등 1900년대 초반 수입된 용어들을 일본어를 거쳐 번역했다. 'Volkslied'의 번역어가 민요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타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노래'라는 의미가 첫째요, 문명의 상징인 문자를 향유해온 특권계층에 대해 구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민중의 노래'라는 의미가 두 번째다. 일본어의 번역어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이 용어는 당초부터 지방성이나 계급성, 문화적 차이가 민족으로 수렴되는 '민족의 노래=민중의 노래'로 일원적으로 파악되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김연자 "노래 좋아 달려온 50년…88 폐막식 하늘 지금도 생각나"
- 2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 3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 4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 5'새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31일 개최
- 6전란 속에 피어난 춤, 김동민 일가의 춤4代가 이어준 '오래된 인연'
- 7도자의 여로 (146)<br> 분청귀얄문잔편
- 8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예술단체 22개 선정
- 9무형유산‧퓨전국악 어우러진 '무등울림축제' 개최
- 10서울문화재단, 노들섬 중심으로‘노들 컬처 클러스터’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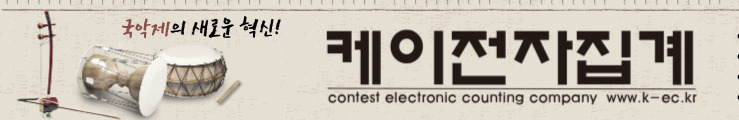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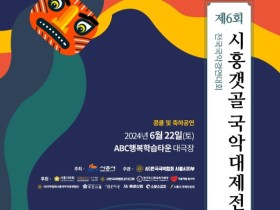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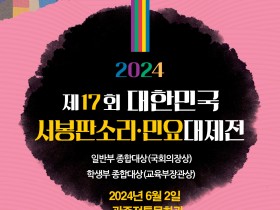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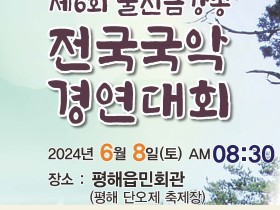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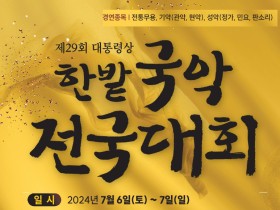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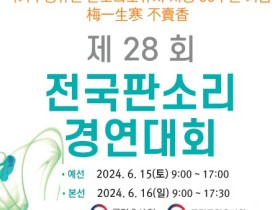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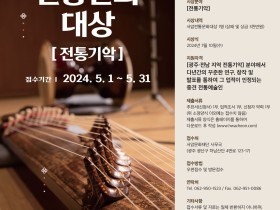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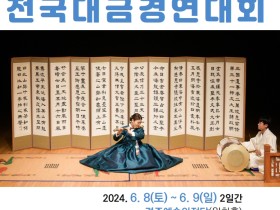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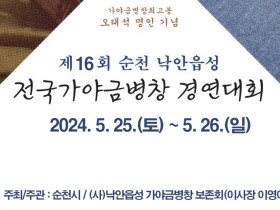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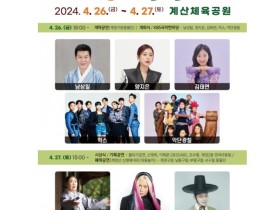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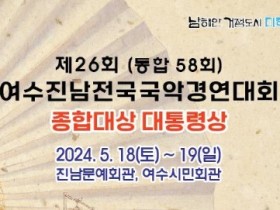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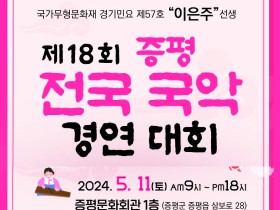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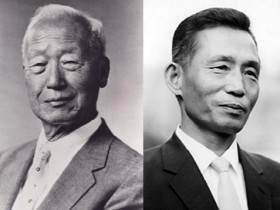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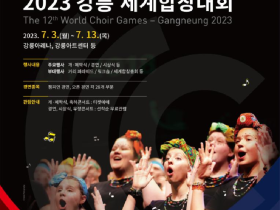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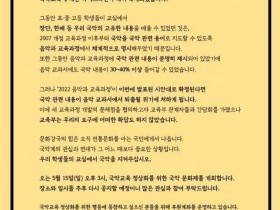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https://www.kukak21.com/data/file/news/thumb-3534942082_xLDkmVCO_6c0ab4c0f9bda5791258891bcfab9234ab950fbd_280x2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