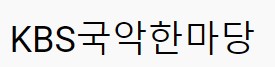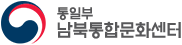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5.09 (목)
연재
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 <4>
박연은 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혼신의 힘을 다 하였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일도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위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신념이었다.
자신을 위해서였다. 왕(세종)을 위하여 왕을 의식하고 말하자면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배웠다. 모든 삶의 근본이고 학문의 근본이었다. 예기 사서삼경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든 학문은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쳤다. 그가 학문에 통달하고 삶의 이치에 얼마나 밝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려 하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이기 이전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될 도리라고 배웠다.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만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로운 아이가 되어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그를 의탁하였다. 외삼촌은 많은 서책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일상의 주고 받는 이야기를 통하여 일거수 일투족의 행동거지를 통하여 가르쳤고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 사람이란 어때야 하며 왜 사는 것이며 왜 배워야 하고 실천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였다.
외삼촌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선생은 십리 정도 거리의 심천 각계리 마을에 살았다. 지금도 김자수 고가古家가 그 자리에 있다. 거기 각계제覺溪霽 선지당先志堂에서 무자기毋自欺 신독愼獨을 배웠다. 사실은 그 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가르쳐 주는 대로 달달 외어 대답을 하였을 뿐 진정한 뜻은 그 뒤 외삼촌이 세상을 뜬 뒤에 알게 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가 되었고 뒤에 전교시판사典校寺判事 좌상시左常侍 충청도관찰사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으나 정세가 어지러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이숭인李崇仁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등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목은牧隱 이색은 순중純仲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기도 했다. 순수의 가운데 순수 그 자체란 뜻인가. 문장이 뛰어나 시문詩文이 동문선東文選에도 실려 있다. 조선 개국 후 태종 때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려가 망한 것을 비관하여 자결하였다.
"신하가 되어 나라가 망하면 함께 죽는 것이 의리이다. 나는 평생 동안 충효에 스스로 힘썼는데, 지금 만약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군부君父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길을 나서 광주廣州 추령秋嶺에 이르렀을 때에 자손들에게 당부하여 일렀다.
"나는 지금 죽을 것이다. 오직 스스로 신하의 절개를 다할 뿐이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 것이니 바로 이곳에 묻고,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절명사絶命詞를 읊었다.
"평생 동안 충효에 뜻을 두었건만 오늘날에 누가 알아주랴?”
상촌 선생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손들은 유명遺命에 따라 추령에다 묘를 쓰고 끝내 비문은 쓰지 않았다.
의리를 굳게 지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마음 속의 부끄러움을 없이하고자 한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120번지, 상촌 김자수 선생의 무덤에 묘도문자를 쓰지 마라고 하였지만 후손들은 그럴 수만은 없었다. 유언으로 묘비는 세우지 않았고 신도비는 땅에 묻었다. 1926년에 후손들이 신도비를 발굴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새로운 신도비를 제작하여 옛 신도비와 함께 세웠다
외삼촌의 절명은 전날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한꺼번에 깨우치게 하였다. 삶의 구석구석 전신의 통증처럼 아프게 와 닿는 것이었다. 왜 사느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이이냐.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되묻게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홀로 있을 때 자기를 삼간다는 그 때의 가르침이 몸부림쳐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심盡心, 성의를 다 하고 마음을 다 하여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간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동안의 덕목들이 가슴에 와 꽂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맹자의 사단四端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하였고.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외삼촌 상촌 선생의 절명과 박연의 관직 생활의 시작은 같은 시기였지만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 최선을 다 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되었는지 모른다. 왕을 위한 일도 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왕은 그를 총애하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90)<br> 춤꾼 송영은의 '강선영류 태평무' 춤사…
태평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강선영(1925-2016)선생에 의해 전해지면서 격조있는 무대예술로 발전 되었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지니...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2)<br>강원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한얼(2024, 선면에 먹, 53× 26cm) 봄바람 불어서 꽃 피건마는 고닯은 이 신세 봄 오나마나 ...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1 <br>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8)…
최근 BTS를 배출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배출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연일 연예 문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약 1조원 가까...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4)<br>거문도 인어 '신지끼' 신격의 계보…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 "안개 있는 날에 백도와 무인도 서도마을 벼랑에서 주로 출몰 바위에 앉아 있거나 헤엄치기도 벼랑위에서 돌 던지기도 한다 해난사고나 바다에서 위험 경고...
-

[PICK인터뷰] 원장현 명인, “산조는 우리 삶의 소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

[Pick리뷰] 경성 모던걸들의 춤판 '모던정동'…"자유 갈망하는 모습 담아"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

세실풍류,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선사한 안덕기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

세실풍류, 동해별신굿 민속춤사위를 제해석한 조재혁의 '현~'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Pick리뷰]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절창 정선아리랑!’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