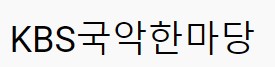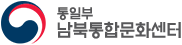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5.08 (수)
연재
한명희/이미시문화서원 좌장
세상에는 상도 참 많다. 갖가지 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상들이 지천이다 보니 개중에는 뒷말이 개운찮은 상들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 많은 상 중에서 과연 좋은 상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내가 보는 좋은 상이란 우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상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상금의 과다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주최측의 명성이나 위엄에서 오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상의 권위는 공평무사한 운영에서 온다. 아름아름 주고받는 상에는 권위가 쌓일 리 없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공히 그저 주기적으로 치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주는 자도 받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받는 자도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시를 쓰는 어느 지인의 말이다. 자기가 아는 문인이 얼마 전 어느 문학상을 받았단다. 그런데 상을 받은 대가로 주최측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상금 이상으로 팔아줘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이 문학계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수상자가 얼마를 내겠다고 먼저 언질을 주고 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시상제도가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상 받았다는 것을 시큰둥하게 보거나 우습게 알기 십상이다.
이 같은 폐단은 전통음악계에서도 간간이 들려온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은연중에, 어떤 때는 아예 드러나게 자기 제자나 지인이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서슴지 않고 부끄러운 짓들을 한다.
꽤 오래전 일이다. 전남 고흥에서 김연수 명창을 기리는 제1회 김연수국악상 심사를 위촉받고 참여한 적이 있다. 김 명창의 수제자를 자임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오 아무개 명창이 심사위원장 역할을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국악 전공자도 아닌 인물을 수상자로 극구 추천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전주에서 국악계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수상 조건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나부터 적극 반대했다. 결국 안숙선 명창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회의가 끝난 후 은밀히 알아보니 오 명창이 열렬히 추천했던 인물은 바로 자기 남편이었다.
이 같은 전통음악계의 시상 풍토를 일거에 쇄신하고 등장한 시상제도가 다름이 아닌 방일영국악상이다. 하기사 방일영국악상은 기존의 여느 국악상들과 같은 지평에서 운위할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만큼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상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를 한국 대표 신문으로 키워 낸 우초愚礎 방일영方一榮 선생이 1994년에 제정한 국악상이다. 기억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1994년은 소위 ‘국악의 해’라고 해서 정부가 한 해 동안 국악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해다. 이어령 문화부장관 시절 그분의 아이디어로 한 해에 예술계 어느 한 분야를 당시 10억 원씩 특별 지원한다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무용과 문학에 이어 세 번째로 국악의 해가 선포된 것이다.
아무튼 유달리 국악을 좋아하며 국악인들을 자별히 배려해 주셨던 우초 선생은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상다운 상을 출범시켰다. 지난해로 4반세기를 맞이한 방일영국악상은 그동안 전통음악계에 적지 않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라면 누구나 내심 수상을 소망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방일영국악상의 권위와 위상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 그간의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구나 그 상의 존재가치를 십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제1회 때의 수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열거해 본다.
제1회 판소리 명창 김소희, 제2회 국악학자 이혜구, 제3회 판소리 명창 박동진, 제4회 정재무 김천흥, 제5회 종묘제례악 성경린, 제6회 서도소리 오복녀, 제7회 판소리 명창 정광수, 제8회 정가 정경태, 제9회 배뱅이굿 이은관, 제10회 가야고 황병기, 제11회 경기민요 묵계월, 제12회 대금 산조 이생강, 제13회 경기민요 이은주, 제14회 판소리 오정숙, 제15회 판소리 고법의 정철호, 제16회 민속음악학 이보형, 제17회 판소리 박송이, 제18회 피리 정재국, 제19회 판소리 성우향, 제20회 판소리 안숙선, 제21회 경기민요 이춘희, 제22회 거문고 김영재, 제23회 사물놀이 김덕수, 제24회 가야고 이재숙, 제25회 한국음악학 송방송.
이쯤 되고 보면 방일영국악상은 상이되 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증언하는 한국문예사의 거대한 물줄기이자 척추 같은 산맥이다. 따라서 그 상은 곧 음악상이되 하나의 독특한 문화현상이자 역사의 실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영예로운 국악상에 나는 직간접적으로 꽤 자주 연계돼 온 셈이다. 직접적으로는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장을 했고, 간접적으로는 수상자들이 부탁한 축사의 글들을 시상식 유인물에 기고해 왔다. 총 25회에 걸친 시상 중에서 16회에 걸쳐서 나의 심사평이나 축하의 글이 실렸으니 이 상과의 인연도 적지 않은 연륜이 쌓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국악신문 독자들에게 귀한 글을 보내주신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지출판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90)<br> 춤꾼 송영은의 살풀이춤 춤사위
태평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강선영(1925-2016)선생에 의해 전해지면서 격조있는 무대예술로 발전 되었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지니...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2)<br>강원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한얼(2024, 선면에 먹, 53× 26cm) 봄바람 불어서 꽃 피건마는 고닯은 이 신세 봄 오나마나 ...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1 <br>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8)…
최근 BTS를 배출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배출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연일 연예 문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약 1조원 가까...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4)<br>거문도 인어 '신지끼' 신격의 계보…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 "안개 있는 날에 백도와 무인도 서도마을 벼랑에서 주로 출몰 바위에 앉아 있거나 헤엄치기도 벼랑위에서 돌 던지기도 한다 해난사고나 바다에서 위험 경고...
-

[PICK인터뷰] 원장현 명인, “산조는 우리 삶의 소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

[Pick리뷰] 경성 모던걸들의 춤판 '모던정동'…"자유 갈망하는 모습 담아"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

세실풍류,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선사한 안덕기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

세실풍류, 동해별신굿 민속춤사위를 제해석한 조재혁의 '현~'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Pick리뷰]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절창 정선아리랑!’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