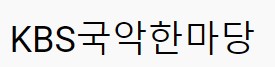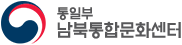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5.08 (수)
연재
한명희/이미시문화서원 좌장
서재 창유리로 늦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그 화사한 햇살을 되받으며 나뭇잎들은 표정과 농암을 달리하며 형형색색으로 오색의 향연을 연출해 내고 있다. 여느 수목들보다 키가 월등한 은행나무는 간간이 스치는 소슬바람결로 파란 하늘폭에다 황금색 노란 붓질을 하고 있고, 늘 푸른 실향나무와 반송 사이로 진홍빛 얼굴을 내민 빨간 단풍가지는 왠지 오늘따라 먼 옛날 농본 시절의 ‘선녀와 나무꾼’ 같은 아련한 사랑 이야기라도 애써 발설해 내고 싶은 품새다.
대자연의 호흡 같은 바람이 또 지나는 모양이다. 울안의 활엽수 단풍잎들이 짧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수수 떨어진다. 그들 낙엽 중에서도 기품 있는 노란 은행잎의 낙하는 단연 압권으로 인상적이다. 필경 차생此生과의 인연을 하직하는 어느 소중한 이들과의 작별만 같아서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황홀한 전면의 풍광을 바라보는 눈길과는 달리, 고삐 풀린 나의 상념은 느닷없이 거꾸로 회전하며 엉뚱하게도 저만큼 어제의 어떤 죽음의 단상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망령스런 상념들의 변덕이 아닐 수 없다. 달짝지근한 추억과 서정적인 밀어들로, 아니면 부평초 같은 인생 행로에 묵직하게 철들어 가는 사색의 추錘를 달아주기 일쑤이던 단풍과 낙엽들이, 어느새 느닷없이 쇠락과 죽음을 첫 화면으로 떠올려 주고 있으니 정녕 희한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엉뚱하다 싶다가도 곰곰 되짚어 보니 이내 수긍이 가며 괜히 계면쩍어지기도 한다. 초속 230여 킬로미터로 내닫는 지구의 공전 속도를 까맣게 잊은 채,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장년쯤이려니 하고 어이없는 몽환 속에 지내온 게 민망해서인 것 같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나들이 때면 지하철 역무원들은 내가 창구에 채 다가서기도 전에 늘 한 박자 빨리 ‘공짜표’를 민첩하게 밀쳐 내주더라니!
적료한 침묵 속에서 나는 진양조 가락 같은 끈적한 곡선으로 낙하하는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며, 어느새 어떤 죽음의 풍경을 아련히 떠올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풍경들을 뒤적뒤적 음미해 본다. 그러고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일의 죽음에 대한 다짐도 슬며시 해 본다.

지난해 늦가을이었다. 나는 아산중앙병원으로 문상을 갔다. 진도 씻김굿 하면 으레 대명사처럼 떠올리던 이름 박병천 예인의 타계였다. 당혹스러우리만큼 빈소의 분위기가 여느 상가와 달랐다. 상주들의 표정도 침울하기는커녕 화평하기만 했고, 조문객들의 분위기도 전혀 낌새가 달랐다. 웬걸, 낯익은 얼굴들과 자리를 함께한 후 들은 얘기는 내심 적잖은 충격이었다.
함께 자리한 당대 명인들인 김덕수나 장사익의 설명조에는 오히려 신명기까지 느껴졌다. "어제 저녁에도 노래로 한판 벌였는데, 내일 저녁에는 더 많은 끼쟁이들이 모여 정식으로 한판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야 고인도 흐뭇해하실 거고, 우리 또한 고인의 진의를 받드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다. 아, 가는 자와의 이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언젠가 다가올 나의 죽음에 대한 기발한 대안이라도 찾은 양 괜스레 기분이 고양돼 그들과 또 한 번의 소주잔을 부딪쳤다.

귀갓길에 탄 버스가 잠실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서울 야경이 새삼 아름다워 보였다. 강심에 잠긴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그 불빛 사이로 훤칠한 키의 박병천 옹이 멋들어지게 북춤을 추는 환상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렸다. 정말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더니 당대 명인과 영별을 하고 나니 아까운 사연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싶었다. 연습으로 익힌 기예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세습돼 물려받은 멋의 원형질에서 우러나는 행운유수行雲流水와 같은 예술판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정도 그렇거니와, 특히 열두 가지가 있다는 진도 씻김굿 중에서 그가 재현해 낼 수 있다고 하던 일곱 가지 유산마저 끝내 역사의 미궁 속으로 영영 사라졌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버스가 한강 다리의 야경을 뒤로 하고 강변길로 들어섰을 때, 내 생각의 끈은 또다시 죽음을 한판 놀이굿으로 받아들이는 낯설지만 매력적인 장면으로 이끌려 갔다. 아니 인생을 얼마나 달관하고 해탈했기에 만인이 칙칙하게 여기는 죽음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며 여유작작하게 한판 통과의례적인 놀이판까지 벌일 수가 있을까? 골똘한 생각 끝에 떠오른 답은 곧 진도 씻김굿이었다. 알려진 대로 진도 씻김굿은 죽은 자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켜 극락세계로 천도薦度시키는 굿의식이다. 절망이나 비탄이 끼어들 계제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리고 축원해야 할 상황이다. 진도 씻김굿판이 비감悲感의 페이소스를 넘어 일렁이는 신명기를 느끼게 되는 연유도 아마 이래서일 게다.
그러고 보니 어려서부터 평생을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신바람의 굿판을 별여 온, 그래서 삶과 죽음이란 종이 한 장 차요, 유명幽明이라고 하는 밝고 어둠의 변환에 지나지 않음을 체관諦觀한 박 옹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는 저만큼 하찮은 다반사茶飯事쯤으로 여겨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쩐지 내가 기획했던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해외 공연에서도, 무대에 오르기 전 거나하게 술 한잔 곁들이고는 무르익은 신명판을 풀어내더라니….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그는 가망 없이 남몰래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문상 중에서야 알았다. 진정 죽음을 초탈했다는 것은 이런 경지이지 싶었다.

7월 12일 저녁이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르코 예술극장에서는 고 김영태 시인 1주기 공연이 있었다. 잘 알고 있듯이 김영태 시인은, 시인이자 화가이자 클래식 음악 마니아이자 무용평론가로 활약한 19세기적 기인奇人 같은 멋쟁이 로맨티스트였다. 문화예술계에 스며든 그의 인간적 매력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표가 바로 그 추모 공연이었다. 서울현대무용단 대표 박명숙 교수와 국립발레단 단장 박인자 교수가 주축이 된 그날 밤 범무용계의 헌정 공연은, 고인에 대한 사모의 정은 물론 죽음에 대한 또다른 의미망을 각자의 가슴속에 촉촉이 새겨 주는 기회가 됐다.
칠흑같은 공간에 침묵이 흐르고, 은빛 같은 한 줄기 조명 핀이 어느 좌석에 꽂힌다. 가열 123번 좌석이다. 특히 무용 공연 때면 늘 개근하던 고인의 붙박이 지정석이다. 핀이 밝힌 좌석에는 채 온기가 가시지 않았을 고인의 모자와 바바리코트와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순간 고인에 얽힌 숱한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뭉클한 회억懷憶에 젖게 했다.
무대는 고인의 면면을 떠올리는 편집 화면과 무언의 몸짓들로 차분하게 이어져 갔다. 야릇한 비감과 미감의 조화로운 교직交織은 가슴에 잔잔한 물무늬를 일으키며 현실을 예술의 진경眞境 속으로 환치해 가고 있었다. 아하, 죽음도 이렇게 삶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날 밤 추모 공연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수목장을 예상해서 고인이 마지막 남긴 유작시 낭송이었다. 제목은 ‘전등사 나무’였다.
강화도 전등사를
내 한 손으로 들지 모르겠다
가볍다 그리고 어질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내 몸인 나무가 정해졌다
나뭇가지에 손이 매달려
내 등을 두드린다
"자네 여기 올 줄 알았지”
잘 왔다고
전등사의 밤
추녀 진보라 곡선 아래
나를 맡겨 버린 나무 서 있다
서해 바다에 떠 있는 빈 배를 향해
늦가을 햇살은 여전히 눈부신데, 창밖에는 또 대지가 후~ 하고 입김을 내뿜는 모양이다. 노란 은행잎들이 우수수 지는 걸 보니.
(본 연재는 이지출판사 출간 '한악계의 별들'에서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를 허락해주신 출판사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90)<br> 춤꾼 송영은의 살풀이춤 춤사위
태평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강선영(1925-2016)선생에 의해 전해지면서 격조있는 무대예술로 발전 되었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지니...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2)<br>강원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한얼(2024, 선면에 먹, 53× 26cm) 봄바람 불어서 꽃 피건마는 고닯은 이 신세 봄 오나마나 ...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1 <br>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8)…
최근 BTS를 배출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배출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연일 연예 문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약 1조원 가까...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4)<br>거문도 인어 '신지끼' 신격의 계보…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 "안개 있는 날에 백도와 무인도 서도마을 벼랑에서 주로 출몰 바위에 앉아 있거나 헤엄치기도 벼랑위에서 돌 던지기도 한다 해난사고나 바다에서 위험 경고...
-

[PICK인터뷰] 원장현 명인, “산조는 우리 삶의 소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

[Pick리뷰] 경성 모던걸들의 춤판 '모던정동'…"자유 갈망하는 모습 담아"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

세실풍류,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선사한 안덕기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

세실풍류, 동해별신굿 민속춤사위를 제해석한 조재혁의 '현~'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Pick리뷰]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절창 정선아리랑!’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