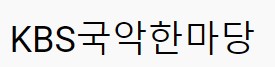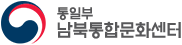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6.02 (일)
연재
흙의 소리
이 동 희
나무와 숲 <4>
지친 심신을 눕힌 채 정신없이 자고 있던 다래는 왜소한 남자의 품을 다시 끌어안으며 의식을 차렸다.
"조금 더 자도 돼요?”
그도 깊은 잠을 자다가 깨며 끌어안고 있는 여인의 팔을 풀어준다. 그리고 큰댓자로 두 팔을 쭉 뻗었다.
여인도 옆으로 널부러지며 하품을 한다.
"그래 푹 더 자. 실컷 자고 가야지.”
여인은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듯 흐트러진 몸을 추스른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인 건 알고 있는거여?”
"아아이. 제가 뭘 어쨌지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으음.”
"선생님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셔야지요.”
"가르칠 게 따로 있지.”
"호호호호…”
그러며 다시 남자를 힘껏 끌어안는다. 목덜미에 입술을 부비기도 하였다.
"다 가르쳐 주셔야지요. 호호호호…”
"으음. 으음.”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래의 행위가 싫다기 보다 참고 견디기가 힘든 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여러날 같이 지내야 하는데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더 자아.”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다래와의 얼핏 이상한 행각이 알려지면 누가 이 사정을 이해할까, 아마 그 자신 이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내의 흑심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탓할 것이 뻔하였다. 본인 다래 자신도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누구보다도 그녀는 믿고 있었고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굽힌 적이 없었다.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누가 뭐래도 밀어붙이는 그였다.
혈육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다래였지만 여악을 금하는 상소를 그 자신이 하여 하루아침에 궁중 출입을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예악의 논리와 국가 대계의 원대한 그림 속에 악도 중요하지만 더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 예였고 그 구도構圖에서 박연의 결단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 깊이에는 그의 다래에 대한 하애下愛가 발휘된 것이었다. 물론 명분은 따로 있어 내세운 대로지만 속마음은 사랑스러운 그녀가 너무 유명해지고 끝간데 없이 널을 뛰는 인기라고 할까 세간의 관심을 주저앉히고자 한 것이다. 장안 한량들이 그녀를 가만 두지 않았고 왕자들도 치정관계를 벌이었다. 세종의 정처인 소현왕후의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平原大君 이임이 물량공세를 취하고 여섯 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 영빈 강씨의 아들 서장자庶長子 화의군和義君 이영이 서로 쟁탈전을 벌이었다. 친형제들이었고 아끼는 왕자들이었다. 앞에서도 얘기하고 시간적으로는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불행의 사태를 막고자 한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라기보다 너무나 아끼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음악의 재질을 발휘하는 데는 꼭 궁중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히려 불편한 조건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안의 사기四妓로 꼽히고 그 중에서도 으뜸의 자리매김을 하던 그녀의 명성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거덜먹거리지를 못하게 되었고 떵떵거리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의 첩이 되고 누구의 소실이 되고 동가숙 서가식 하며 곡예를 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이름난 기녀들도 사정은 같을런지 몰랐지만 다래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다.
대단히 신통한 것은 궁중의 여악을 폐하도록 상주하고 실행한 것이 누구인 것을 알고도 불평 한 마디 언짢은 소리 한 마디 않는 것이었다. 물론 그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뒤에도 그랬다. 미안하게 됐다든지 일이 그렇게 되었다든지. 어디까지나 도덕 군자로서 그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그녀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 어떻든 이 세상에 이 천지에 그가 아니면 그녀를 구하여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니라 진주 같은 보물 같은 나라의 귀인이었던 것이다.
박연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애처롭고 귀여웠다. 눈을 감았다.
이미 각오한 일 저질러진 일이었다. 그녀를 구하고 살려야 하는 것이다.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도 그렇고 그녀도 그랬다.
"그래. 맞아.”
- [] <br>제24회 부평국악대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07/13)
-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대명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7일간 열전
- [] 제24회 공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07/12-13)
- [] 제26회 서라벌전국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07/13-14)
- [] 제3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06/23) (판소리.무용.기악)
- [] 제4회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대회(08/01)
- [] 제6회 시흥갯골국악대제전(06/22)
- []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 제8회 한국예술무형유산 전국경연대회(06/22)
- [] 제17회 대한민국 서봉판소리·민요대제전 (06/02)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br>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추천해주세요.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br>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5)애국창가 수록 ‘애국가’와 ‘한영서원가’의 가치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애국창가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은 ‘애국창가’를 등록유산 제475호로 지정했다.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7)<br> 분청내섬시명발편
도편의 반 이상이 내섬명 이규진(편고재 주인) 내섬시(內贍寺)는 각 궁전에 대한 공상, 2품 이상에게 주는 술, 왜와 야인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 등의 일을 맡아보던...
-

[국악단체장에게 듣다] 영남의 '강태홍류 산조춤' 전승하는 보존회장 김율희
김율희 (강태홍류 산조춤 보존회 회장) 김율희 이사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전통춤 4대 가업을 잇는 무용가다. 조부 김동민과 고모 ...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5)<br>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을 쓰다. 한얼 이종선, (2024, 문양에 먹, 34× 34cm) 담뱃불로 벗을 삼고 등잔불로 님을 삼아 님아 님아...
-

"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현역 최고령 무용가인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극장에서 열린 '세계 무용사'출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
-

[Pick리뷰] 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공연 '일노래, 삶의 노래' 공연 장면. (사진=국립국악원 ) 2024.05.22. 소박하고 향토적인 ...
-

[Pick리뷰] 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세븐틴 일본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 (사진=위버스 라이브 캡처) "오늘 저희가 (데뷔) 9주년인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전 세...
-

[Pick리뷰] 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사진=물고기뮤직) 2024.05.26.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죠....
-

[Pick리뷰] 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2024 남산소리극축제 ‘여설뎐(女說傳)- 싸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극을 주도하는 ...
-

[PICK인터뷰] 김연자 "노래 좋아 달려온 50년…88 폐막식 하늘 지금도 생각나"
가수 김연자 (사진=초이크리에이티브랩) "오로지 노래가 좋아 달려온 50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든 순간도 다...
-

[대기자 인터뷰] 공연예술로 하나가 되는 '더원아트코리아' 최재학 대표를 만나다
2년 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연희대전'이란 이름의 한 공연이 있었다. 제1회 '장구대전'이란 부제가 붙어있고, 입장권 전석이 판매 되어 화제가 되었다. 무대에서 오직 '장...
-

[PICK인터뷰] 두 줄이 내는 다채로운 숨, 해금 연주자 강은일 교수를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나무 그늘이 우거진 5월의 한복판, 양재동의 한 공원에서 곧 있을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인 해금연주자 강은일 교수님을 만났다. 지저...
-

伊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 "한지, 유네스코 등재될 가치 있어"
이탈리아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인 마리아 레티치아 세바스티아니 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연구소(ICPAL) 소장이 최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
-

[PICK인터뷰] 긴 호흡으로 들려준 산조의 정수, ‘긴산조 협주곡’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9일에서 10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이 펼쳐졌다.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이 협주곡으로 초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