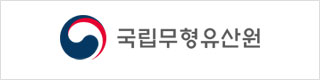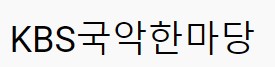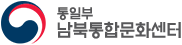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6.02 (일)
- [] <br>제24회 부평국악대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07/13)
-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대명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7일간 열전
- [] 제24회 공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07/12-13)
- [] 제26회 서라벌전국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07/13-14)
- [] 제3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06/23) (판소리.무용.기악)
- [] 제4회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대회(08/01)
- [] 제6회 시흥갯골국악대제전(06/22)
- []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 제8회 한국예술무형유산 전국경연대회(06/22)
- [] 제17회 대한민국 서봉판소리·민요대제전 (06/02)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br>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추천해주세요.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br>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5)애국창가 수록 ‘애국가’와 ‘한영서원가’의 가치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애국창가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은 ‘애국창가’를 등록유산 제475호로 지정했다.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7)<br> 분청내섬시명발편
도편의 반 이상이 내섬명 이규진(편고재 주인) 내섬시(內贍寺)는 각 궁전에 대한 공상, 2품 이상에게 주는 술, 왜와 야인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 등의 일을 맡아보던...
-

[국악단체장에게 듣다] 영남의 '강태홍류 산조춤' 전승하는 보존회장 김율희
김율희 (강태홍류 산조춤 보존회 회장) 김율희 이사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전통춤 4대 가업을 잇는 무용가다. 조부 김동민과 고모 ...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5)<br>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을 쓰다. 한얼 이종선, (2024, 문양에 먹, 34× 34cm) 담뱃불로 벗을 삼고 등잔불로 님을 삼아 님아 님아...
-

"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현역 최고령 무용가인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극장에서 열린 '세계 무용사'출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
-

[Pick리뷰] 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공연 '일노래, 삶의 노래' 공연 장면. (사진=국립국악원 ) 2024.05.22. 소박하고 향토적인 ...
-

[Pick리뷰] 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세븐틴 일본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 (사진=위버스 라이브 캡처) "오늘 저희가 (데뷔) 9주년인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전 세...
-

[Pick리뷰] 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사진=물고기뮤직) 2024.05.26.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죠....
-

[Pick리뷰] 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2024 남산소리극축제 ‘여설뎐(女說傳)- 싸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극을 주도하는 ...
-

[PICK인터뷰] 김연자 "노래 좋아 달려온 50년…88 폐막식 하늘 지금도 생각나"
가수 김연자 (사진=초이크리에이티브랩) "오로지 노래가 좋아 달려온 50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든 순간도 다...
-

[대기자 인터뷰] 공연예술로 하나가 되는 '더원아트코리아' 최재학 대표를 만나다
2년 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연희대전'이란 이름의 한 공연이 있었다. 제1회 '장구대전'이란 부제가 붙어있고, 입장권 전석이 판매 되어 화제가 되었다. 무대에서 오직 '장...
-

[PICK인터뷰] 두 줄이 내는 다채로운 숨, 해금 연주자 강은일 교수를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나무 그늘이 우거진 5월의 한복판, 양재동의 한 공원에서 곧 있을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인 해금연주자 강은일 교수님을 만났다. 지저...
-

伊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 "한지, 유네스코 등재될 가치 있어"
이탈리아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인 마리아 레티치아 세바스티아니 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연구소(ICPAL) 소장이 최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
-

[PICK인터뷰] 긴 호흡으로 들려준 산조의 정수, ‘긴산조 협주곡’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9일에서 10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이 펼쳐졌다.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이 협주곡으로 초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