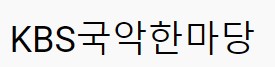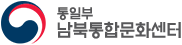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4.20 (토)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는 것. 부모를 잘 만나 제대로 배우고 좋은 직업을 골라 남한테 존경받으며 살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윤윤석(尹允錫ㆍ55, 1939년 4월 14일생) 씨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맺혀 있다.
열 두 살 적부터 시작한 ‘광대 인생’이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좋아서도 아니었다. 때로는 자기 흥에 겨워 가진 자와 구경꾼들 앞에서 아쟁을 켜고 뜯으며 소리(창)도 질러 댔지만 생각해 보면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럭저럭 국악과 함께 해 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 40여 년이다.
아쟁은 우리의 민속 악기 중에서도 일반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악기이다. 거문고와 가야금의 ‘대중성’만을 취택해 놓았음직한 아쟁은 고려 때 유입된 당악기 중의 한 종류이다. 가야금을 개조해 8현으로 농현하지만 모양은 거문고와 같이 운두가 얕고 상자식으로 짜서 만든다. 별도로 머리 편을 괴는 발(足), 운족(雲足), 담괘, 담괘 뒤판의 모양, 줄 매는 법 등은 거문고와 전혀 달라 구분된다. 개나리 채를 말총으로 맨 활에 송진 가루를 문질러 연주하는 조현 기법이 매우 독특하다.
그런데 이 아쟁 소리가 사람을 잡는다. 경기민요에 피리 빠지면 헛것이듯 이 저 구성진 남도 가락에 아쟁 빠지면 ‘들으나 마나’라고 한다.
"거문고가 ‘선비 악기’고 가야금이 ‘규방 악기’라면 아쟁은 시정 민초들의 짓눌림을 토해 내는 ‘아낙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쟁의 농현으로는 유일하게 연주자의 감정을 담아 낼 수가 있지요.”
선뜻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기탄 없이 털어놓는 윤씨도 아쟁 연주 얘기를 하면서는 목에 힘이 들어간다. 애절한 감정 농도가 짙게 밴 비탄조의 선율은 평소 국악에 관해 무심했던 사람들조차 "바로 이 소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 ‘조선 사람’치고 여남은 가지 한도 없는 사람이 있간디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적 한이 골수로 전해 올 테니까요. 그런데다 민초들의 쓰린 앙금이 가라앉은 이 소리를 들으면 울적했던 심회가 왈칵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아무리 악기가 명기라 할지라도 주자의 마음 이상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의 초상집에 가 제 설움에 겨워 울듯 연주자가 살아 온 인생의 우여곡절 깊이가 아쟁 소리를 구슬프게도 내고 행복한 성음으로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악계에선 윤씨를 ‘아쟁 도인’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그는 인간문화재도 아니고 생계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연구소도 하나 없다. ‘따라지 인생길’이라고 스스로 자괴하면서도 개나리 활대만 잡으면 만사가 태평이다.
서울 종로구 누상동의 두 칸짜리 전세방에서 들려주는 ‘윤씨의 인생’은 우리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예인 거의가 그러하듯이 참으로 참담하고 기구했다.
전북 익산군 여산면 태생인 윤씨는 아버지(영택)가 가야금 명인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이름을 한자로 모른다고 했다. 가야금통 메고 삼남이 내 집이라며 동가식 서가숙하던 아버지 때문에 풀뿌리로 연명하고 메뚜기를 볶아 주린 배를 채우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할말은 아니지만 기왕 조실부모할 바에는 아버지부터 돌아가셔야 합니다. 풋보리를 절구로 찧어 멀건 죽을 쑤어 주시던 어머니가 굶주림 끝에 죽고 나니 3남매(1남2녀)는 결딴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한테 덕 안 되는 소리는 해서 뭘합니까.”
부모가 팔자라던가. 이리시 갈산동으로 이사 와 살게 된 윤씨는 ‘나팔이라도 불어 먹고살자’며 국악원을 찾아갔다. 그 때 나이 열 두 살. 이리 국악원에서는 ‘아버지 얼굴’을 보아 찡그림 없이 거둬 주었다. 윤씨가 일생을 통해 부모 덕본 것은 ‘이것뿐’이라고 한다.
피내림,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다. 윤씨는 가야금은 말할 것 없고 새납(호적), 설장구, 꽹과리, 장단북 등 잡기만 하면 척척이었다. 싹수있게 본 국악원의 이창선(李昌善, 명창) 씨가 싸잡고 단가와 흥부가를 가르쳐 목을 틔게 해주었다.
7~8년간을 온갖 궂은일 도맡으며 장단이라면 비껴 나가는 엇박까지 낚아채게 됐다. 아홉수가 원수런가. 19세에 다시 아버지 시신을 확인하고는 유랑길에 나섰다는 그는 "부전자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나 보다.”며 모처럼 웃었다. 역마살 낀 기왕의 광대 인생 임춘앵 극단, 박후성(朴厚性)의 화랑극단, 진경단체 등을 전전하며 악사로 장단을 맞춰 왔다. 이 때 이골이 나버린 진양(느린 장단)에서 휘모리(아주 빠른 장단)의 박자 감각은 아직까지도 탁월하다.
이 기간 중 임춘앵 극단에서 만난 한일섭(韓一燮, 1972년 작고) 씨와의 인연으로 윤씨는 평생을 아쟁과 함께 살게 된다. 일제 유랑 극단 시절부터 아쟁의 명주자였던 한씨는 새납 연주에도 일가를 이뤄 생존 당시부터 ‘전설적 광대’로 불렸던 주인공이다. 그 한일섭 씨한테 아쟁 주법을 물려받은 윤윤석 씨다.
"종로 권농동에 살던 한선생님을 찾아가 밤늦도록 아쟁을 배운 때가 있었습니다. 짐짓 바깥 공기가 이상해 창문을 열면 동네 사람들과 길 가던 행인들이 골목을 그득 메운 채 선생님 연주를 듣곤 했지요. 남들도 신기에 가깝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악계의 아쟁 산조는 한일섭제와 정철호(鄭哲鎬)제로 대별되는데 감정 표현 기법과 장단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일섭제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박자가 구성되며 감정 표현법이 애절하기 비길 데 없다.
스무 살에 한씨를 만나 아쟁 활대를 잡은 이후 윤씨는 35년 동안 오로지 아쟁을 안고 살아 온 것이다. 한때는 놀음청에 불림 받아 목돈도 만져 보았지만 술로 날려 버렸다. 자신이 훑어 내는 아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는 게 무엇인가 싶었고, 구차한 인생 푸념을 달래 줄 건 오직 술뿐이라 생각했다며 뼈아픈 후회를 한다.
윤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술 외에는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상복도 지지리 없는데다가 가정마저 평탄치를 못했다. 돈복은 아예 벗어 아직도 이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했다. 자신의 ‘밥줄’인 아쟁도 일반화된 지가 오래지 않았다 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에도 못 오르고 있다. 요즘같이 명리 밝은 세상, 인간문화재 지정 가망이 없는 국악기에 일생을 걸 젊은이들이 없다.
요즘 들어서는 막내아들(윤서경, 청운중 3년)한테 아쟁 활대를 잡히고 있다. 이런 각박한 인심 속에서도 윤씨는 오직 아쟁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조영제(調永濟, 33) 씨가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한다. 윤씨만이 해낼 수 있는 지범질 주법(활대를 사용 않고 엄지와 검지로 뜯는 연주법)은 보존이 시급한 새로운 창제다. 아주 빠른 휘모리에서 엇모리, 엇박으로 넘겨 채는 주법이 까다롭지만 조씨는 무난히 소화해 내고 있단다.
"직업이나 직장은 농사꾼의 전답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가꾸고 일군 만큼 소출을 얻겠지요. 흔히 내 처지가 불우하고 시원찮으면 남을 원망하지만 저는 마음 편히 삽니다. 내 대에 인간문화재가 안 되면 다음에라도 되겠지요. 다만 예술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 초판 1995., 4쇄 2006., 이규원, 정범태)
- [] 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br>[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제11회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4회 금천정조대왕맞이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4/13-14)
- [] [세종시]제10회 통일기원 세종전국국악경연대회(04/06-07)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141)<br>분청상감대호편
작지만 문양이 이채로워 이규진(편고재 주인) 명품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과 부안이 쇠퇴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는 고려 말의 혼란한 정국이라든...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88)<br>원주어리랑, 산은 멀고 골은…
원주어리랑을 쓰다. 한얼이종선 (2024, 문양지에 먹, 34 × 34cm)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87)<br> 정인삼 명인의 '신칼대신무' 춤사위
신칼대신무 신칼대신무는 무속장단과 巫具를 활용한 재인의 춤으로, 장단과 움직임의 법도 있는 만남을 잘 보여주는 춤이다. 구한말 화성재인청에서 가르친 50여 가지의...
-

[화요연재] 무세중과 전위예술(9) <BR>김세중의 한국민속가면무극 춤사위 발표회19…
멍석 위에서 민속극에 뜻을 둔 이래 가장 절실했던 것은 둔한 몸을 가지고 직접 춤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생활의 분신의 하나인 전통 민속극과 좀처럼 사귀어...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0)<br>잔인한 적군의 시신까지 거든 바다의…
왜덕산(倭德山)의 비밀 피아를 나누지 않고 위령 바다사람들 심성 깃들어 왜군에도 그러해야 했던 섬과 바다의 민속 관념은 인류의 박애 정신 아닐까 교착상태 빠진 한·일 문...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88)
갑진년 사월에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오거서루주인 이종선 (2024, 한지에 먹,48 × 56cm) ...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
-

[인터뷰] 김경혜의 '시간의 얼굴' 작품전, 16일 개막
칠순을 넘어서는 길목에서 중견작가 김경혜(영남이공대 명예교수) 작가의 열번째 작품전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대구시 중구 슈바빙 갤러리에서 열린다.전시되는총 50여 개...
-

[Pick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이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후의 지휘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졌다. (사진=국립국악관현악단...
-

[PICK인터뷰] 국악인생 60여년,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한상일(1955~)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입문한 지 올해로 60여 년을 맞는다. 때 맞춰 지난 1월 25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서 선정하는 제15회 문화대...
-

[Pick리뷰] 명연주자 시리즈 ‘국악관현악-공존(共存)’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4 명연주자 시리즈 ‘공존(共存)’ 무대가 펼쳐졌다. ‘명연주자 시리...
-

[Pick리뷰]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12일부터 22일, 국립정동극장은 대표 기획공연 사업 ’창작ing’의 두 번째 작품,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을 무대에 올렸다. ‘두아:...
-

한류의 의외의 원류? ‘일본아리랑’에 놀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곡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노래다. 각종 스포츠 대회나 정상회담 만찬회 등 공식 행사에서는 어김없이 연주되...
-

[인터뷰] 이즘한글서예가전 신인작가 이광호 작가의 시선
봄바람을 타고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네번째이즘한글서예가전에서 출품한 30명의 작가 중 가장 젊은 신인작가라고 한얼 회장이 소개를 한 3분의 작가 중 이광호(43세)...
-

[Pick리뷰] 전통 탄탄한 국악관현악: ‘작곡가 이강덕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지난 7~8일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Ⅲ’을 선보였다.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가 된 작곡가를 선정해 의미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