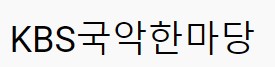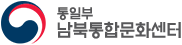2024.04.23 (화)
연재
한명희/이미시문화서원 좌장
가벼운 몸살기를 느끼며 느지막이 일어나 창밖을 본다. 연무가 자욱하고 만추의 소슬한 가을비가 실낱같이 내린다. 기류가 흐르는지 마당가 은행나무 잎들이 노란 나비들의 군무같이 흩날린다. 가속도로 늙어가는 나이 탓인지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는 지인들의 혼백 같다는 생각도 든다. 통유리 창가의 내 익숙한 의자에 화석처럼 앉아 씁쓸 달짝지근한 조락의 우수에 잠기다가, 하루 일과의 관성처럼 조간신문을 집어들었다.
‘양치기 백석(白石/1912~1995)’이라는 칼럼이 대뜸 눈에 띄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전날 나는 대학에서 지기처럼 지내던 몇몇 교수들과 환담하며 우연히 백석과 자야(子夜/1916~1999) 얘기로 꽃을 피우지 않았던가. 백석 시인의 애인이었던 자야 여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지난 80년대 말엽쯤의 일이 아닌가 한다. 당시 서울음대 김정자 교수가 자야 여사를 모시고 남양주 덕소의 내 우거(寓居)를 방문했다. 김정자 교수는 가야고 전공이지만 자야 여사에게 우리 전통가곡을 따로 배우고 있었다. 자야 여사, 그러니까 김진향(金眞香/김영한)은 전통가곡의 맥을 잇고 중흥시킨 금하 하규일(琴下 河圭一) 스승을 사사했다. 말하자면 전통가곡의 정맥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자야 여사가 멀리 덕소까지 내방한 뜻은 음악 얘기가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녀는 시정의 아낙들과는 달리 확실히 걸출한 안목이 있었던 듯싶다. 전통음악이나 전통문화를 꽃피우려면 당장 목전의 음악적 기량에만 매달리면 안 되고, 멀리 보고 좋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며 자기 지론을 폈다. 그리고 돈은 자기가 댈 터이니 내가 인재학교를 세워서 키워 달라는 제의였다.

물각유주(物各有主)라고 했던가. 세상에 인연이 닿지 않으면 복이 굴러와도 눈치마저 채지 못하는 모양이다. 물론 나는 전공이 따로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사양했다. 지금 생각하면 일말의 후회가 없지도 않다. 알량한 지식만으로 무장한 재승박덕형 인사들이 하도 요란을 떠는 저간의 세태를 겪다 보니 참다운 인성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뒤늦게 절감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당시 천억대가 넘는다던 성북동의 대원각은 영재교육의 종잣돈이 될 인연을 살짝 비켜서 법정 스님에게 넘겨졌고, 그 후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야 여사는 웬만한 범부들이 부끄러울 만큼 선공후사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었다. 아마도 법도 있는 권번 생활을 하면서 당대 숱한 우국지사형 대장부들과의 교유에서 받은 영향이 아닐까 한다.
국립국악원장으로 있을 때였다. 한 번은 대원각 기부 사실을 떠올리며 여사에게 국악원 발전기금을 넌지시 부탁했다. 그분의 소유로 대원각 외에 서초동에 큰 빌딩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사는 왠지 국약계를 위해 쓰자는 말에는 마뜩찮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자야 여사의 선행이 또 언론에 보도되었다. 시가 백억여 원이 넘는 서초동 빌딩을 과학영재를 키워 달라며 과기처에 희사했다는 기사였다.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살아오며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의 경계를 일찌감치 간파했는지, 여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살이 공수래공수거의 삶을 깔끔히 솔선수범했다.
자야 여사는 나를 만날 때마다 힘주어 말한 얘기가 있다. 당신 살아 생전에 스승 하규일 선생을 기리고, 백석을 국문학계에 현창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부끄럽게도 당시 나는 백석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자야 여사의 그 같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해, 아마도 90년대 초반이지 싶다. 여사가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서울시립대 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쓴 원고 뭉치를 내게 건넸다. 자신과 백석 시인 사이의 사랑 얘기를 쓴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데, 한번 읽어 보고 잘 다듬어 달라는 청이었다. 예상대로 여사의 글은 어법이 서툴고 문투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성 또한 진부했다. 조금 손 좀 봐서 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여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국문학 전공 박사과정 정도의 학생을 소개해 드릴 테니 아예 처음부터 환골탈태해야 되겠다고….
그 후 얼마마한 시간이 흘렀는지는 기억이 없다. 자야 여사가 내게 책 한 권을 보내왔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내 사랑 백석’이라는 제호의 책이었다. 속지에는 ‘한명희 선생깨 6월 22일 1995년 김진향’이라고 친필 서명이 돼 있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지만 원고의 문투처럼 ‘선생께’라야 할 철자를 ‘선생깨’로 표기한 사실도 역시 그녀다운 어법이다 싶어 오히려 친근감이 느껴졌다.
자야 여사를 알고 지낸 기간은 십여 년 남짓. 한강교 옆 외딴 고층 아파트 댁에 초대를 받기도 했고, 어느 때는 덕소 내 집 마당 단풍나무 밑 평상에 앉아 하규일제 전통가곡을 시범 삼아 부르기도 했다. 간혹 외국을 다녀올 때면 내가 약골이라고 건강식품을 챙겨 주기도 했고, 특이한 술을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야 여사와 나는 자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소원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서울 하늘 밑에 서로 믿고 지내는 지인 한 분 계시는 정도의 친교 거리였지 싶다.
한 세기가 저물어 가던 1998년도의 일이다. 자야 여사에게서 저녁식사를 하자는 전화가 왔다. 약속한 서초동의 어느 일식집으로 나갔다. 그때의 만남에서 얻은 잔상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여사의 옷차림이었다. 나는 그동안 여사가 그토록 대담하게 튀는 정장을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래위를 모두 순백의 양장으로 갖춰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치장돼 있었다. 깔끔하고 정갈한 그분의 성품이 촌치의 착오도 없이 의상으로 표출된 분위기였다.
그날 만남의 요지는 당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가곡 한바탕을 국악원에서 녹음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다. 그 일이 있고부터 하규일 전승의 가곡은 국악원 악사들의 반주로 간간이 녹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사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 갔고, 긴 호흡으로 노래할 기력마저 소진돼 갔다. 결국 이듬해 자야 여사는 이승의 마지막 소망을 미완으로 남긴 채 삶을 영별하고 말았다. 나와의 느슨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인연도 이렇게 과거지사로 뜬구름같이 흩어져 갔다.
(본 연재는 이지출판사 출간 '한악계의 별들'에서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를 허락해주신 출판사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 [] 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제11회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0 <br>‘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7) …
지난 회에서 가곡과 시조의 차이를 이야기하였다. 가곡은 5장 형식, 시조는 3장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불려지는 전통가곡의 효시는 고려가요인 ‘정과정’이라는 곡이라...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1)<br>모내기철 논둑으로 향하는 그 어떤 …
쌀에 대한 명상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쌀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던 것인가? 여기서의 쌀을 문화나 문명으로 바꿔 읽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141)<br>분청상감대호편
작지만 문양이 이채로워 이규진(편고재 주인) 명품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과 부안이 쇠퇴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는 고려 말의 혼란한 정국이라든...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88)<br>원주어리랑, 산은 멀고 골은…
원주어리랑을 쓰다. 한얼이종선 (2024, 문양지에 먹, 34 × 34cm)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
-

[인터뷰] 김경혜의 '시간의 얼굴' 작품전, 16일 개막
칠순을 넘어서는 길목에서 중견작가 김경혜(영남이공대 명예교수) 작가의 열번째 작품전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대구시 중구 슈바빙 갤러리에서 열린다.전시되는총 50여 개...
-

[Pick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이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후의 지휘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졌다. (사진=국립국악관현악단...
-

[PICK인터뷰] 국악인생 60여년,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한상일(1955~)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입문한 지 올해로 60여 년을 맞는다. 때 맞춰 지난 1월 25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서 선정하는 제15회 문화대...
-

[Pick리뷰] 명연주자 시리즈 ‘국악관현악-공존(共存)’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4 명연주자 시리즈 ‘공존(共存)’ 무대가 펼쳐졌다. ‘명연주자 시리...
-

[Pick리뷰]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12일부터 22일, 국립정동극장은 대표 기획공연 사업 ’창작ing’의 두 번째 작품,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을 무대에 올렸다. ‘두아:...
-

한류의 의외의 원류? ‘일본아리랑’에 놀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곡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노래다. 각종 스포츠 대회나 정상회담 만찬회 등 공식 행사에서는 어김없이 연주되...
-

[인터뷰] 이즘한글서예가전 신인작가 이광호 작가의 시선
봄바람을 타고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네번째이즘한글서예가전에서 출품한 30명의 작가 중 가장 젊은 신인작가라고 한얼 회장이 소개를 한 3분의 작가 중 이광호(43세)...